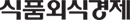코로나19 위기를 벗어나면서 일본 식품·외식업계가 딜레마에 빠졌다. 세계적인 고물가로 인해 식재료비가 급등하면서 업체마다 원재료비는 크게 올랐지만 음식 가격을 인상할 수 없어 고민이다.
일본 식품·외식업계는 지난해 3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엔데믹이 시작될 당시 매출이 급증하고 호황을 누릴 수 있다는 기대에 부풀었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도 좀처럼 매출은 증가하지 않고 있다. 소비자들의 위기 심리가 아직도 팽배하기 때문이다.
매출이 증가하지 않자 폐업하는 외식업체들이 크게 늘어나는가 하면 매물로 나오는 점포들도 증가하고 있다. 대다수 업체들은 차라리 코로나19 위기 당시가 좋았다고 지적한다.
코로나19 위기 당시에는 정부에서 지원해준 누적 지원금 탓에 견딜만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코로나19 위기 당시보다 매출은 늘지 않고 정부의 지원은 끊겨 영업을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다는 지적이다.
대중음식점들은 급등하는 원재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메뉴의 양을 줄이는가 하면 소폭의 가격 인상을 감행하는 분위기다. 기자가 일본 친지와 유명 돈가스 전문점을 방문했을 때도 코로나19 사태 이전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눈에 띄게 양이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물론 가격은 그대로였다.
반면 일부 고급음식점들은 구인난으로 인해 예약인원을 줄이고 객단가를 올리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동경에서 고객이 접대를 위해 가장 선호하는 S점포의 경우 월 예약인원을 기존 1만2000명에서 9000명으로 줄이고 객단가를 30% 인상하는 모험을 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 당장은 내점고객이 늘릴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급등한 가격 벽을 넘어 호황이 지속될 지 의문이다.
일본의 식품업계는 소포장 제품이 확대되고 있다. 물론 1인 가구가 늘고 소식을 원하는 소비자가 급등한 원인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가격을 올릴 수 없으니 소포장을 통해 원가를 줄이려는 속내도 엿보인다. 대형마트나 편의점에서 소포장 도시락이나 샐러드가 불티나게 판매되고 1/4 피자나 튀김 한 개를 소포장한 제품까지 등장할 정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거품경제가 무너진 이후 25년간의 장기불황 속에서 ‘마른수건도 짜면 물 나온다’는 기업가 정신을 가진 일본 식품·외식기업들이 세계적인 고물가시대를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궁금하기만 하다.